<이원호의 경제톡>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2025-10-07
여기에 최근 산업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는 새로운 축이 등장했다. 바로 청록수소(Turquoise Hydrogen)이다. 청록수소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CH₄)을 고온에서 직접 열분해하여 수소(H₂)와 고체 탄소(C)를 동시에 생산한다. 가장 큰 특징은 연소 과정 없이 진행되어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하지 않거나 극히 적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수소 생산 패러다임을 바꿀 ‘탈탄소화’와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청록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에서 열분해(Methane Pyrolysis)하는 과정에서 수소와 고체 탄소를 동시에 얻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거나, 발생량이 극히 제한적이다. 무엇보다도 부산물로 나온 고체 탄소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철강 첨가제, 화학 원료, 배터리 음극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 다시 말해, 청록수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소재를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생산된 고체 탄소의 품질에 따라 시장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고순도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로 활용되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저순도 탄소도 타이어 제조, 철강 산업의 환원제, 건축 자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부산물의 판매 수익은 청록수소의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 그린 수소보다 훨씬 빠르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런데 청록수소가 한국의 에너지 여건에 최적화된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CO₂ 저장 부지 문제이다. 블루 수소의 대규모 도입을 위해서는 대륙붕 등 방대한 CO₂ 저장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질학적 특성상 한국은 CCS 부지가 극히 제한적이며, 환경과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청록수소는 아예 CO₂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제약을 일거에 해소한다.
둘째, 그린 수소의 대규모 공급 한계이다. 그린 수소는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한국은 좁은 국토와 일조량의 편차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막대한 해외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곧 에너지 안보 문제로 직결된다. 청록수소는 기존에 잘 갖춰진 천연가스 도입 및 배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에 용이하다.
셋째, 수요처 연계를 통한 경제성 조기 확보이다. 한국은 철강(환원제), 석유화학(촉매), 배터리(음극재) 등 고체 탄소 부산물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청록수소 생산 시설을 이러한 수요 산업 단지 인근에 구축한다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부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르게 청록수소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는 단순히 수소를 싸게 생산하는 것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국형 수소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청록수소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메탄 열분해 촉매, 반응기 설계, 부산물 고체 탄소의 고부가가치화 기술 등 핵심 분야에 국가적 R&D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관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청록수소 생산을 수요처인 철강, 배터리 산업과 연계해 초기 시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제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청록수소 인증제도'를 조기 도입해 생산·유통 단계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RE100을 벤치마킹한 'CH100(청록수소 100)' 같은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소경제는 아직 정답이 없는 실험의 장이다. 그러나 CCS 부지가 부족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제한적인 한국에서 청록수소는 '불리한 조건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청록수소를 대규모 상용화 모델에 성공한다면, 단순한 에너지 확보를 넘어 수소 기술의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록수소를 단순한 대안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한국 수소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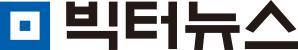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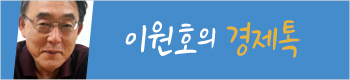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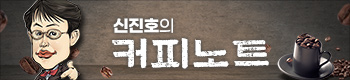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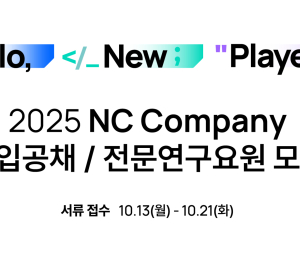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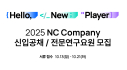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