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 고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통통신 3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차갑다. 3년 전 '세계 최초'라며 야단법석을 떨며 5G 시대를 열었지만 비싸진 요금제에 여전한 음영지역으로 ‘무늬만 5G’라는 비판이 거세다. 5G 단말기 수요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수혜도 크다. 'LTE 대비 20배 빠른 세상'이 허풍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5G 시대 이후 기업들 배만 부르고 반대로 국민 통신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고 기준 이통 3사의 5G 무선국 46만대 가운데 기지국은 43만대(94%)인 반면 중계기는 3만대(6%)에 그쳤다. 기지국은 주로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설치돼 실외 지역을, 중계기는 실내 음영지역 품질을 개선하는 데 주로 쓰인다. 이는 LTE의 중계기 비중 76만대(33%)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비싼 요금제를 쓰면서도 5G가 안터져 울며겨자먹기로 LTE를 이용해야하는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이야기다. 실제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5G 서비스의 실외 커버리지는 전년 대비 252.1% 증가했지만, 다중이용시설과 인빌딩(실내) 커버리지는 각각 58.3%와 38.4% 증가에 머물렀다. 대도시와 농어촌·도서지역의 품질 격차도 크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862Mbps, 전라남도는 722Mbps에 불과했다. 같은 요금에도 품질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수익성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2019년 3조864억원이었던 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2020년 3조3509억원, 지난해 4조2401억원으로 치솟았다. 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5G 가입자 증가 덕분이다. 5G 가입자 수는 2020년 말 기준 1185만여명에서 지난해 11월 2000만명으로 두배로 불어났다. 각 사 전체 무선 가입자 중 5G 가입자 비율도 40%를 돌파했다. 연내 3000만명 이상이 5G에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요금제도 LTE 시대 5만~7만원대가 주를 이뤘다면 5G에선 8만~10만원대가 중심이다. 비판이 커지면서 통신사들이 4만~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긴 했지만 제공 데이터량이 10GB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소비자를 우롱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많다.
통신사들은 설비투자도 줄이고 있다. 통신 3사 설비투자액은 재작년 8조2720억원에서 지난해 8조2050억원으로 0.8%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다. 올해도 설비투자는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직원들 연봉도 뛰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34%(4000만원), KT는 8%(700만원), LG유플러스는 16%(160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같은 설비투자 감소가 5g 통신에 대한 소비자 품질 불만이 폭증하는 와중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통신 품질' 불만 건수는 지난 2019년 19건에서 최근 2년간 12배 가까운 223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연맹이 5G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이용자의 91.3%는 5G 요금제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66.1%는 LTE로 서비스를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49.8%가 ‘5G 요금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품질 문제를 외면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13일 대통령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하면서 대통령 인수위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5대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통신사들이 이미 설비 투자비 회수가 끝난 LTE를 유지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10년간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과 폭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5G 시대 이후 통신사들은 수익성은 좋아지고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반값통신비, 보편요금제 등 요금제를 다양화시키고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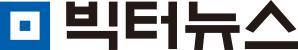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