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리 기술이 아닌, 미식에 대한 깊은 이해 요구”
2025-10-16

포스터는 작품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한 장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어떤 작품인지 말하고(정보), 알리며(홍보), 선택케(관객) 하는 용도를 지닌, 일종의 명함이라 할 수 있겠다. ‘포스터it’은 지극히 주관적인 시선으로 작품의 포스터를 오밀조밀 들여다본다.
칠흑 같은 어둠의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있다. 왕관 모양으로 파인 독특한 드레스의 무늬가 아름답다기보단 위태로워 보인다. 그녀의 목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왕관의 뾰족한 꼭지점 때문일까. 여인의 드레스와 그 뒤편을 가득 메우는 검은색의 밀도가 마치 체홉의 ‘갈매기’ 속 마샤가 입고 다니던 인생의 검은 상복 같다.
그나마 그녀의 혈색을 돌게 하는 건 핏빛 커튼 아래 드리워진 붉은 입술과 빨간 매니큐어 정도다. 그녀 앞에 무릎 꿇은 저 사내의 머리 위에 왕관이 씌워지는 순간, 그녀는 생의 욕망과 파멸을 동시에 거머쥘지도 모른다. 그녀의 유일한 욕망의 실체는 곧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었음을 모르는 채로 말이다.
사내의 눈동자는 한겨울을 맞은 듯 얼어붙어 있다. 사내 앞에 서 있는 여인의 파인 등 위에 놓여있는 검 때문일까. 혹은 “왕을 죽여요”라고 여인이 사내의 귀에 속삭이기라도 한 것일까. 여인의 목덜미가 칼자루가 되어 사내의 손에 쥐어져 있다. 칼자루를 쥔 건 사내일까 여인일까. 아니면 서로에게 겨눈 칼날일까.
왕좌에 오른다 한들 저 사내의 욕망은 쉬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다. 검에 묻은 한 번의 피가 권력으로 탈바꿈하는 순간 자신에게 반하는 이들을 모조리 베어낼 위험에 가까워지는 까닭이다. 어쩌면 잘라낸 왕관과 검은 애초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혼령의 저주가 빚어낸 잠깐의 환영이었을 뿐,
그렇게 여인과 사내는 성큼 다가온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자신의 손에 묻어있던 피를 떨쳐내려 애쓰며, 누군가의 목에 끊임없이 칼을 겨누며 서로의 목을 옥죈다. 파멸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서서히 영혼을 잠식해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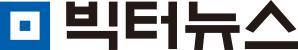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